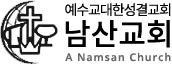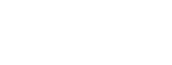오십 보, 백 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영순 댓글 0건 조회Hit 1,092회 작성일Date 25-05-23 17:19본문
사람이란 존재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오십 보, 백 보’라는 말이 있고, ‘도긴개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 날카로운 평가입니다.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주 못난 사람과 그저 간발의 차이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극히 자주 우리는 이 오십 보를 도저히 따르지 못할 거리로 생각하고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땅에서 볼 때야 이 거리가 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높은 하늘에서 볼 때야 그게 어디 거리 축에나 드는 것이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추스르게 됩니다.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 심각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자신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비판은 늘 무성하지만 그 비판을 듣고 자신을 고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비판이 상대에게 해당하는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다윗도 이런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그가 밧세바를 끌어들여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후에 있은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암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운 한 가난한 사람과 그 양을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 사악한 부자에 대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악한 부자를 자신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부자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아니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가혹한 판결인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삼하 12:5)는 사형선고까지 내립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을 모릅니다.
이 사건을 듣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이야기의 그 사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그러한 일을 행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입에서 거리낌 없이 그 악한 부자를 향하여 가차 없이 사형선고가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거나, 혹은 들은 후에 우리 나름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도 늘 인색하리만치 가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결국 자신에게 주어졌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악한 부자가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결코 그와 같은 가혹한 판결까지는 내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아니라, 용서할 자격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고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인해 “그건 너다”라는 정죄가 “그게 나다”라는 인식으로 전이될 때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관용으로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달라 보여도 ‘오십 보 백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김 재 구 목사
그 이유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오십 보, 백 보’라는 말이 있고, ‘도긴개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 날카로운 평가입니다.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주 못난 사람과 그저 간발의 차이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극히 자주 우리는 이 오십 보를 도저히 따르지 못할 거리로 생각하고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땅에서 볼 때야 이 거리가 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높은 하늘에서 볼 때야 그게 어디 거리 축에나 드는 것이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추스르게 됩니다.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 심각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자신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비판은 늘 무성하지만 그 비판을 듣고 자신을 고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비판이 상대에게 해당하는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다윗도 이런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그가 밧세바를 끌어들여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후에 있은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암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운 한 가난한 사람과 그 양을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 사악한 부자에 대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악한 부자를 자신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부자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아니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가혹한 판결인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삼하 12:5)는 사형선고까지 내립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을 모릅니다.
이 사건을 듣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이야기의 그 사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그러한 일을 행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입에서 거리낌 없이 그 악한 부자를 향하여 가차 없이 사형선고가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거나, 혹은 들은 후에 우리 나름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도 늘 인색하리만치 가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결국 자신에게 주어졌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악한 부자가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결코 그와 같은 가혹한 판결까지는 내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아니라, 용서할 자격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고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인해 “그건 너다”라는 정죄가 “그게 나다”라는 인식으로 전이될 때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관용으로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달라 보여도 ‘오십 보 백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김 재 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