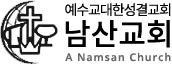"어느 女 聖徒의 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형도 댓글 2건 조회Hit 4,628회 작성일Date 14-10-27 14:53본문
- 이 글은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 "회복의 신앙"중 일부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순간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투병생활, 그 기도와 애원, 몸부림, 그리고 바
램,,,,,,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한 미련한 그리스도
인이요 아내였다. 나는 문득 나 자신에게 물었다. 아니,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남편을 위해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분명히 내게 요구하신 명령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했
을까? 나는 벽에 머리를 찧고 싶었다. 그렇다. 부질없는 삶의 외적 조건들만 성취하느라 눈
에 보이는 신앙의 겉껍질들만 가꾸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의 본질들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다 성취했다고 자만했던 데 대한 자책
감이 이별 그 자체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은 실은 하나의 허상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오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는 묘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만 사로잡힌 내게 하나님은 더 이상 오해받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공의로운 두려움이 나
를 엄습했다. 참으로 두려웠다. 진실로 삶의 조건을 초월해서 순수하게 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강한 자책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혼 생활 14년, 나는 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님이
되기를 원했던 남편과 신학을 하기 원했던 나 사이에, 언제나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인간적인 수양과 덕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그를 보며 위선이라 평했고, 나 자신의 인격적
결함은 원죄를 인정하는 기독교적 실존의 참모습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러나 이 땅에
서 마지막으로 무의식 속을 헤매며 누워 있는 남편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존귀한 그를 새로 만나고 접했다. 우리는 말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는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람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아빠였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우리의 눈
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 결혼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 엮이고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아이는 멋있게 살 거야.' 내가 대답했다. '천국은 아름다울
거예요.' 평소의 대답처럼 동문서답이었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소망만
이 넘치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만족보다 더 진한 행복의 맛이
었다. 무대 연주 5분 전과 같이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
우리 세 식구를 맡긴다는 강한 용기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영원 속으로 그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비로소 나는 평소에 꿈꾸던 참사랑의 본질을 체험하는 벅찬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
다. 그는 가야만 했다. 아이와 나는 아빠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는 피가 나지 않는 것이 아빠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이와 나는 하나님께 아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먼저 가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스러웠지요.' 나의 이 마지막 말에 그 역시 고
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죽음은 참으로 평화스러웠고 비장하게 아름다웠다.
오히려 그 순간 그가 부러웠다. 나는 울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통탄
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강권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의 장도를
살아남아 있는 나 자신의 서러움으로 방해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이야
기했다. 아니 그것은 성령님의 명령이었다. '용감해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고통을 감수해
라. 그것만이 영원 속에 거하고 있는 그를 위해 이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사랑이다.'
나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미소 지
었다. 마음속으로 울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웃었다. 그것은 내 슬픔을 승화시켜 주시는 하
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나의 신앙고백이었다. 오늘도 나는 울면서 또 웃는다.
기가 막힌 이별 속에서 참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미소를 짓는
다.
나누고자 합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순간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투병생활, 그 기도와 애원, 몸부림, 그리고 바
램,,,,,,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한 미련한 그리스도
인이요 아내였다. 나는 문득 나 자신에게 물었다. 아니,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남편을 위해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분명히 내게 요구하신 명령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했
을까? 나는 벽에 머리를 찧고 싶었다. 그렇다. 부질없는 삶의 외적 조건들만 성취하느라 눈
에 보이는 신앙의 겉껍질들만 가꾸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의 본질들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다 성취했다고 자만했던 데 대한 자책
감이 이별 그 자체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은 실은 하나의 허상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오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는 묘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만 사로잡힌 내게 하나님은 더 이상 오해받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공의로운 두려움이 나
를 엄습했다. 참으로 두려웠다. 진실로 삶의 조건을 초월해서 순수하게 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강한 자책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혼 생활 14년, 나는 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님이
되기를 원했던 남편과 신학을 하기 원했던 나 사이에, 언제나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인간적인 수양과 덕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그를 보며 위선이라 평했고, 나 자신의 인격적
결함은 원죄를 인정하는 기독교적 실존의 참모습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러나 이 땅에
서 마지막으로 무의식 속을 헤매며 누워 있는 남편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존귀한 그를 새로 만나고 접했다. 우리는 말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는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람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아빠였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우리의 눈
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 결혼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 엮이고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아이는 멋있게 살 거야.' 내가 대답했다. '천국은 아름다울
거예요.' 평소의 대답처럼 동문서답이었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소망만
이 넘치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만족보다 더 진한 행복의 맛이
었다. 무대 연주 5분 전과 같이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
우리 세 식구를 맡긴다는 강한 용기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영원 속으로 그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비로소 나는 평소에 꿈꾸던 참사랑의 본질을 체험하는 벅찬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
다. 그는 가야만 했다. 아이와 나는 아빠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는 피가 나지 않는 것이 아빠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이와 나는 하나님께 아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먼저 가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스러웠지요.' 나의 이 마지막 말에 그 역시 고
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죽음은 참으로 평화스러웠고 비장하게 아름다웠다.
오히려 그 순간 그가 부러웠다. 나는 울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통탄
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강권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의 장도를
살아남아 있는 나 자신의 서러움으로 방해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이야
기했다. 아니 그것은 성령님의 명령이었다. '용감해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고통을 감수해
라. 그것만이 영원 속에 거하고 있는 그를 위해 이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사랑이다.'
나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미소 지
었다. 마음속으로 울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웃었다. 그것은 내 슬픔을 승화시켜 주시는 하
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나의 신앙고백이었다. 오늘도 나는 울면서 또 웃는다.
기가 막힌 이별 속에서 참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미소를 짓는
다.